[칼럼] 나영무 박사의 '말기 암 극복기'(5)
-
692회 연결
-
0회 연결
본문
"암환자, 이럴 때 서럽다"...나영무 박사가 털어논 유상철 비화
항암치료 기간 동안 암환자의 외출은 조심스럽다.
항암 부작용으로 체력이 확 떨어지거나, 어지럼증 및 피로 등 돌발변수가 생길 수 있어서다.
비교적 몸 컨디션의 사이클이 좋게 올라왔을 때 미뤄둔 볼 일을 몰아서 본다. 컨디션이 올라와도 피로로 인해 3시간 이상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항암제를 맞고 난 뒤 1주일 지나 은행을 찾은 적이 있다.
일을 마치고 차로 돌아가는데 배에서 가스가 꽉 찬 느낌이 올라왔다.
‘가스가 나오려나’고 생각하는 순간 변실금 실수를 하고 말았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창피하고 당혹스러웠다.
황급히 차 트렁크에서 혹시 몰라 준비했던 비상용 속옷을 꺼내들고 은행 화장실로 향했다.
속옷을 갈아입는데 왠지 모를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다.
‘인간의 원초적 기능도 제대로 못하다니...’라는 생각에 자존감마저도 무너져 내렸다.
이후 외출할 때에는 화장실 위치를 확인하는 한편 돌발 상황을 대비해 속옷도 준비하게 됐다.
대장암 환자의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는 배변문제다.
특히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을 때가 최고조다.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장 자체가 불안한 상태인데, 항암제는 약한 곳을 집중공략하기 때문이다.
기침을 하거나 심지어 찬물만 먹어도 장이 반응하면서 변이 새어 나왔다.
하루 평균 10번이상 화장실을 들락거렸는데 심한 경우에는 30번이나 간 적도 있다.
배변문제 다음으로 힘들었던 것은 몸의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다.
어느 날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끼익 끼익’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주차면에 맞춰 반듯하게 후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옆에 주차된 차를 긁으며 가고 있었다.
운전과 주차 만큼은 베테랑이었던 나를 당황하게 만든 순간이었다.
이런 실수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후 주차 차량이 없는 벽기둥 쪽으로 조심스럽게 차를 댔지만, 내 차 옆면은 벽면을 긁으며 가고 있었다.
나중에 이유를 알아보니 말초신경염 등 항암 부작용에 따른 감각 신경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확하게는 내 몸에서 느끼는 감각, 즉 균형감각을 유지해 주는 코디네이션 기능이 무너진 것이다.
원인을 알았으니 대응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했다.
배변문제는 약해진 항문괄약근의 힘을 키우는데 집중했다.
복부 마사지와 함께 케겔운동, 코어운동이 효과적인데 일상생활에서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의자에서 하는 것이다.
의자에 앉아 배꼽을 약 20% 안으로 집어넣은 뒤 허리는 펴고, 항문을 오므리고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10초 동안 유지하는 동작이다.
이 동작은 케겔운동과 코어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는데 집과 진료실에서 틈날 때마다 반복했다. 또한 팔을 의자에 대고 엎드려 뻗쳐 자세를 30~60초간 유지했다.
그 결과 하루 배변횟수가 10회 이하로 감소했고, 현재는 4회 정도로 줄어들었다.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으로 한발로 서있기를 꾸준히 했다.
처음에는 15초 동안 한발로 서 있다가 익숙해지면 30초~60초 가량으로 늘렸다. 이후 숙달되면 눈을 감고 하면서 효과를 높였다.
그리고 벽에 손을 댄채 팔을 펴고 좌우로 체중이동을 했다.
이를 통해 팔, 다리와 몸의 평형감각과 균형감각(밸런스)을 조금씩 찾아갔다.
이처럼 몸에 생긴 부작용은 해법을 찾아 하나하나 풀어가면 되지만 좀처럼 극복되지 않는 슬픔이 있다.
바로 ‘암 투병 동지’들의 갑작스런 부고를 접할 때다.
암환자들은 주변에서 다른 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나, 암으로 세상을 떠난 유명 인사들의 뉴스를 접하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다. 특히 자신과 인연이 있었던 지인들의 부고는 슬픔과 충격의 강도가 더 컸다.
1996년부터 축구 국가대표팀 주치의를 맡았던 나에게 ‘투혼’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두 명 있다.
1998년 프랑스월드컵 당시 ‘붕대투혼’을 펼친 이임생, 그리고 ‘유비’ 유상철 감독이다.
유상철은 2001년 6월 컨페더레이션스컵 멕시코 전에서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고도 헤딩 결승골을 터트렸다.

2001년 컨페더리이션스컵 멕시코전. 유상철 선수가 코뼈 부러진 상태로 헤딩골을 넣어 2-1 승리를 이끈 장면. 중앙포토
경기 후 히딩크 감독은 다음 경기(호주전)에 유상철의 출전여부를 놓고 나에게 의견을 물었다.
나는 “부러진 뼈가 뇌 쪽으로 밀려 더 큰 손상이 올 수도 있으니 출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히딩크 감독도 고심끝에 받아들였다.
이때 유상철은 간절하면서도 단호하게 “호주전은 뛸 수 있다. 꼭 뛰게 해 달라”고 떼를 쓰다시피 했다.
자신보다 팀을 먼저 생각한 그의 헌신과 강한 승부근성은 가라앉았던 선수단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결국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를 쓰는 ‘원팀’의 자양분이었다.
누구보다 강했던 그가 2019년 10월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말기 암이라는 얄궂은 운명이 야속하기만 했다.
나처럼 고달픈 항암의 길로 들어선 그에게 ‘유상철은 결코 병으로 쓰러지지 않을거야’라며 마음의 응원을 보냈다.
매스컴을 통해 항암치료를 씩씩하게 받으며 호전된 그의 상태를 들을 때마다 나 역시 덩달아 기뻤다.
그의 존재는 함께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는 든든한 암 투병 통지였다.
하지만 2021년 6월7일.
암세포와 사투를 벌이던 유상철은 끝내 눈을 감았다.
갑작스런 비보에 나는 한동안 멍했다.
가슴 한쪽이 휑해지면서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죽음이란 단어가 이제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두려움에 쉽게 잠들지 못했다. 며칠간은 무력감과 우울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만큼 투병 동지의 빈자리가 주는 상실감은 컸다.
돌아보면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답은 결국 사람이었던 것 같다.
나의 진료실에서 평범한 일상을 사는 환자들과 소통하면서 따스한 위로를 받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다.
삶과 죽음의 외줄타기에서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무거웠던 마음에서 차츰 벗어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에서 멀티플레이어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있을 그에게 새해 안부를 전한다.
“투혼의 승부사 유상철 감독님, 오늘따라 당신이 무척 그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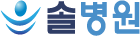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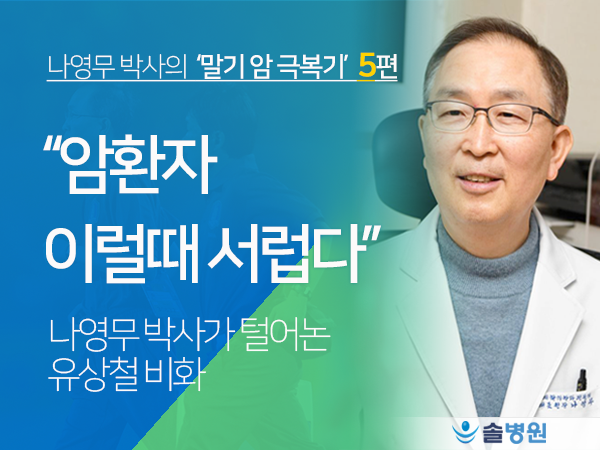
댓글목록 0